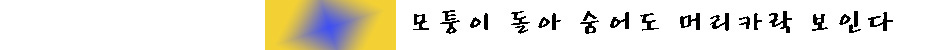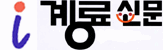칼럼/사설
 재활용도 힘든 소모품과 불량식품은 버릴 때
재활용도 힘든 소모품과 불량식품은 버릴 때
70년대 초등학교 앞 점방에는 대기업 제조업체 이름을 흉내 낸 출처 불분명한 불량식품들이 어린 아이들을 유혹했다. 영양이 부족했던 아이들은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식품인줄만 알고 있었다.
지방정치를 시장경제 논리로 견줘볼 때, 지역의 실상은 악덕상혼이 판치는 30년 전 재앙에 가깝다. 불량식품으로 수혜를 받은 세력이나 조직(단체 등)들은 재앙이라면 무조건 반긴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소리는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더 선호하고 이념도 신념도 없는 상품을 주변에 권장한다.
그러나, 이젠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즐겨먹던 불량식품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분별하지 못하는 고객의 혀 속에서 잠시 달콤한 향만 피우면 그만이라는 계산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서 판치고 있는 불량식품들의 본색은 이제 불량식품 애호가들에게서도 멀어져 있다. 한 불량식품 애호가였던 시민은 이렇게 말한다.
“지들이 무슨 메이커인 것처럼 폼 잡아서 사먹어 봤더니, 맛이 딱 그 수준이다. 고객들이 달콤한 향에 잠시 찬사를 보내면 고개를 꾸벅꾸벅 거리며 자신이 진짜 메이커인 신상품인 것처럼 착각하고, 유통기간을 연장하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불량식품은 동정심을 구걸하는 특징과 핑계거리를 생산하여 합리화시키는 역겨운 공통점이 있다. 때로는 고객에게 무서운 병을 안겨주기도 하고 감쪽같이 메이커를 바꾸고 신 상품으로 변신하여 눈속임하기도 한다.
재활용도 힘든 소모품과 유통기간 지난 불량정치는 우리 삶의 피폐한 정서만 남겨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