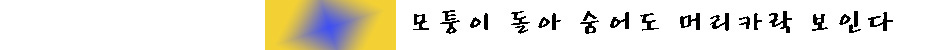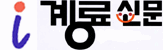교육/문화/예술 - grnews.co.kr
 [최영민의 책이야기] 가끔 주변사람들이 왜 책을 읽느냐 물을 때가 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언제나 같다. 그건 심심해서이다. 그냥 지내기엔 너무 긴 세월이다. 또, 어떤 의미의 관계망도 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만날 수 있어서 좋다. 나에게 읽기란 공시적으로나 통시적 시공간의 제한을 훌쩍 뛰어넘는 소통과정이다. 그러나 소통이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지 자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아의 내면과의 관계까지 함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완전한 의미의 소통은 아니다.
[최영민의 책이야기] 가끔 주변사람들이 왜 책을 읽느냐 물을 때가 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언제나 같다. 그건 심심해서이다. 그냥 지내기엔 너무 긴 세월이다. 또, 어떤 의미의 관계망도 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만날 수 있어서 좋다. 나에게 읽기란 공시적으로나 통시적 시공간의 제한을 훌쩍 뛰어넘는 소통과정이다. 그러나 소통이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지 자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아의 내면과의 관계까지 함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완전한 의미의 소통은 아니다.
김인숙의 '소설집 브라스밴드를 기다리며'는 이런 현대인의 소통부재에 관한 몇몇 다른 이름의 단편들이 표제작인 <브라스밴드를 기다리며>와 함께 8편 묶여 있다. 그 소통불능 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소설집 '브라스밴드를 기다리며'는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삶의 길과 마주하게 되는 아이러닉한 생의 단면을 투사한다. 여기서는 단편 <브라스밴드를 기다리며>에 관해서만 이야기 하고자 한다.
<브라스밴드를 기다리며>에서 영화감독인 나는 암 선고를 받고 석 달간의 시한부 생을 남겨둔 친구 기태의 부탁으로 그의 죽음을 촬영한다. 무엇이 날 데려가려고 하는 건지, 그 자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친구의 부탁으로 촬영을 했지만 그 촬영하는 내내 함께 공유했던 생의 찬란했던 순간들에 오히려 매몰되어 테이프를 없애버린 나는 친구의 죽음 후 1년 반 만에 아내의 암 발병 소식을 듣는다.
그것도 아내의 애인에게 그 소식을 접하면서 남편인 자신도 모르는 남자에게 먼저 그 소식을 전하고, 어떻든 죽게 될 거라는 아내라는 여자를 대하며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그 여자를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는 혼돈 속에서 아내를 사랑했는지조차 모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아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아내가 집을 정리하다가 이미 모두 정리해 놓은 텅 빈 앨범과 서랍 속에서 거리를 행진하고 있는 브라스밴드 사진 한 장을 보게 된다. 뜻밖의 사진을 통해서 기실 자신이 아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내 아내라는 사실 이외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된다.
또 이 사진 한 장을 단서로 아내가 중학교 때 잠시 브라스밴드부에서 트럼펫을 불었고, 폐병으로 그나마 그만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내의 죽음 후에 알게 되고, 불륜에 대한 복수심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촬영하기 시작한 나는 결국 아내를 향한 카메라 렌즈를 통해 자신의 애인에게도, 남편인 내게도 머물고 싶지 않았다는 여자, 내 아내가 진정 머물고 싶은 곳이 브라스밴드의 행렬속이였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아내의 장례식 후 아내가 자신의 모습을 혼자 촬영해놓은 테이프를 보고 혼자 일어설 수도 없이 위중한 상태에서 어떻게 혼자 카메라를 켜고 담담히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지 의아해하며 친구를 데려갔고 아내를 데려간, 이제 나를 데려가기 위해 찾아올 자, 그 자와 대면하게 된다. 아내가 없는 빈 집에서 전원이 켜져 있지 않는 텔레비전 모니터를 응시하며, 영화감독이며 한 여자의 남편이었으며 아주 많은 사람들의 친구이지만, 바로 자신에게는 딱히 어떻게 이름 붙여야 할지 알 수 없는 모니터 속에 자신을 아내의 죽음을 통해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와의 대면이란 늘 이렇게 미망과 맹목의 대가로 얻은 상처 속에서나 겨우 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아내의 죽어가는 모습을 찍어가면서 아내의 삶 속에 남아있는 찬란했던 기억들을 발견하고, 아내가 기억하는 자신과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여정이다. 카메라를 들이밀고 있는 남편 영모에게 “뭐가 보여?” 라고 묻는 아내의 생의 마지막 질문은 일년반 전에 죽은 친구가 던지고 간 질문이기도 하며, 책을 훌쩍 빠져 나와서 독자에게 던지는 일종의 방백과도 같은 질문이기도 하다./글 최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