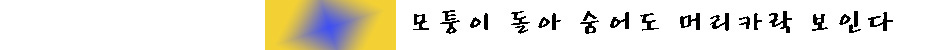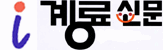교육/문화/예술 - grnews.co.kr
 [최영민의 책이야기]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김영하/ 문학동네
[최영민의 책이야기]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김영하/ 문학동네
어떤 이유에서든 죽음이란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 그것도 자기 생명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갖는다는 윤리적 입장에서 선택된 자살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아노미 상태를 초래한다. 왜냐면 우린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에서 화자인 '나'는 "압축할 줄 모르는 자들은 뻔뻔하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살도우미이다. 그는 거리에서 섹스피어의 말처럼 "죽음이 감히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비밀스런 죽음의 집으로 달려들어간다면 그것은 죄일까?\"하고 배회하는 사람들 중에 고객을 발견한다.
'나'는 한눈에 고객이 될 사람을 알아보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고객을 선별할줄 아는 눈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돈을 많이 지불하는 고객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그는 소설을 쓰기 때문에 '창작 작업에 중요한 모티브를 줄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선호한다. "이 시대에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에게는 단 두가지의 길이 있을 뿐이다. 창작을 하거나 아니면 살인을 하는 길"이리고 굳게 믿으면서.
이 소설이 제1회 문학동네 신인작가상을 수상했을 때, 문단엔 적지 않은 파문이 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너무나 획기적인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건조하고 냉랭한 문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써 내려간 작가의 냉담함에 놀라고 그 촘촘하게 얽혀있는 진실적 허구에 소름이 끼쳤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큰 틀은 세 개의 그림, 다비드의 「마라의 죽음」과 클림트의 「유디트1」, 들라크루아의 「사르다나팔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그림들은 모두 자살안내원인 화자가 생각하고 실현시키려는 죽음을 상징한다. 「마라의 죽음」에서는 죽음을 대하는 건조하고 냉랭한 다비드의 예술적 재능을 부러워하며 자살도우미로서의 역할에 전범을 삼는다. 클림트의 그림「유디트1」는 자살도우미가 선택한 고객의 이름이자 인물들의 전형을 이룬다.
원래 '유디트'는 아시리아의 장군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하여 잠든 틈에 목을 잘라 죽였다는 고대 이스라엘의 여걸이다. 그러나 클림트의 유디트는 '민족주의와 영웅주의를 거세하고 세기말적 관능만을 남겨 둔' 작품이라고 한다. 이 소설 속에서 유디트는 '세연'이라는 여성이며 비엔나 여행 중에 만난 홍콩 여성, 또 행위예술가인 '미미'라는 여성이기도 하다. 이상하게도 자살도우미에게 손을 내미는 고객은 모두 여성이다. 남성은 그저 알파벳 'C'이거나 'K'라는 익명성을 안고서 유디트인 여성, 여성인 유디트를 사이에 두고, 한 남자가 현재의 시간을 영원히 비디오카메라에 담아 놓는 일을 하는 비디오아티스트라면 또 한 남자는 현실의 시간을 거스르기라도 하듯 총알택시를 운전하며 자기 인생에 가속페달을 늦추지 않는 사람이다.
만나면 늘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 말하며 섹스 중에도 추파춥스 사탕을 먹는 유디트(세연), 생수를 절대 먹지 않으며 콜라만 먹는 유디트(홍콩여성), 자신의 행위예술을 비디오에 담고서 '영원히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것 속에 내가 담겼다는 게 두려워졌다고\' 말하는 유디트(미미). 이들은 고흐의 풍경화와 자화상 중에 모두 자화상을 좋아하는,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며 '자신의 내면을, 실존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인 것이다. 이들을 죽음으로 안내하는 주인공인 '나'는 결국 들라크루아의 그림「사르다나팔의 죽음」에서 죽어가는 여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바빌로니아의 왕 사르다나팔이다.
'마라의 죽음'에서처럼 죽음을 주재하되 격정에 휘둘리지 않는 얼굴, 이것이 바로 예술가의 지상덕목이라 여기는 한 자살안내원이며 소설작가인 \'나\'는 곧 이시대의 신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 소설은 환타지다. 자살을 선택하는 유디트들의 빈약한 캐릭터설정만 빼고 플롯자체가 환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 자살사이트가 엄연히 존재하며, 매스컴을 통해서는 전쟁과 대량살상의 현장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어느 여배우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살이 전혀 개연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단적 우울증으로 전파되는 오늘날 말이다. 어쨌든, 겨울은 가고 봄이다. '봄은 우울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만드는' 계절이다. 누군가 다가와서 멀리 왔는데도 아무 것도 변한 게 없지 않느냐고, 또는 휴식을 원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지어다.